한국일보 파리특파원·문화일보 시사저널 워싱턴 특파원 역임

닉슨은 세 살 때 어린이용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놀라운 건 머리가 피범벅이 되고도 기어코 다시 마차에 올라탄 독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근성은 그가 1960년 존 F. 케네디와의 대선 경쟁에서 분패하고도 2년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재도전하는 대목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인물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더니 6년 후인 1968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거듭 출마, 대권의 마차에 기어코 오릅니다.
예의 유년시절 접근을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의 인물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입해 봅니다. 미국 대선 일자(11월 8일)가 오늘(22일)로 정확히 79일 후로 임박했음에도, 아직껏 수수께끼인 트럼프의 정체를 규명해내는 데 그의 유년시절 이상 가는 잣대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년으로 창간 150년을 맞는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올 6월호에서 트럼프의 유년시절을 소상히 소개했습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댄 맥아담스 심리학 교수가 ‘애틀랜틱’에 기고한 ‘트럼프의 정신상태(The Minds of Donald Trump)’란 제하의 칼럼 속에는 트럼프가 자서전에서 말한 그의 유년시절이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의 출사표로 출간한 자서전 ‘불구가 된 미국: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Crippled America: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언급한 유년시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의 퀸즈와 브루클린의 아파트 수십 채의 소유주였던 아버지(프레드 트럼프)는 주말이면 으레 나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순시에 나섰다.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아파트 벨을 누르고 나서 왜 번번이 담벼락 뒤로 숨는 거지요?’ 아버지는 ‘입주자 중엔 문을 향해 총을 갈겨대는 놈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지옥 바닥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상대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귀찮게 굴던 음악교사의 눈퉁이를 갈겨 밤퉁이로 만든 것도, 동네 제일의 꼬마 악당이 된 것도, 또 열세 살에 아버지의 희망대로 뉴욕 시내 예비육사에 입학했던 것도 다 그래서다. 아버지는 내게 늘 분노를 지니고 살 것을,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최고를 골라 깔아 눕히는’ 또 다른 최고 킬러(killer)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맥아담스 교수의 칼럼은 엄밀히 말하면, 칼럼이라기보다는 심리학 논문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편집자가 ‘한 심리학자가 본 도널드 트럼프의 퍼스낼리티 연구’라는 부제를 달아 미국의 학식 있는 독자들의 시선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역설적 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유년기 기질이 성인이 된 후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추적한 글로, 필자 맥아담스는 추적의 용구(用具)로 ‘과도한 외전(外轉·extroversion)’이라는 심리 전문용어까지 써가며 그 구체 사례를 다음과 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달인으로 불리던 미국의 여성 앵커 바바라 월터스가 1987년 트럼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널드, 당신은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임명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다음은 트럼프의 답변: ‘아니, 정반대다. 내가 사랑하는 건 사냥 그 자체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닉슨 역시 가치나 이념 추구와는 무관한 ‘과도한 외전’의 전형적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시절 피범벅이 된 머리로 기어코 다시 마차에 오른 닉슨이 훗날 역대 백악관 주인 가운에 가장 교활하고 냉소적 대통령으로 바뀐 걸 보면, 유년시절 ‘분노’를 자양분으로 자란 트럼프가 훗날 막말과 폭언의 최고 ‘킬러’로 바뀐 것과 똑같은 외전의 전개이지요.
‘애틀랜틱’의 이번 논문을 제가 유독 반기는 건, 대선 시즌이 되면 미국의 매체 거개가 공화 아니면 민주 양당 중 택일해온 습관을 이 월간지만은 훌쩍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 접근도 배제하고 오직 심리전문가의 진단 하나에만 의존했다는 점, 이런 객관적 접근이야말로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저널리즘의 표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 롤모델로 미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1767~1845)을 거론한 것은 맥아담스 논문의 백미로 보입니다. 잭슨의 대통령 취임식 날 백악관에서 열린 축하 파티는 해진 바지에 진흙이 너덜대는 장화 차림 등 별의별 직종의 하객들로 붐볐고, 막판에는 이들의 주정과 고함으로 접시가 깨지고 벽화가 박살 나는 난장판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 소동으로 보수 일색의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고,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의 입에서 “미 대통령이 되기에는 가장 부적합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등장 이후의 지금과 똑 닮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제퍼슨은 평소 다혈질인 잭슨이 외국 원수한테 당한 극히 사소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선전포고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 평소 욱 하는 기분에 핵 발사 버튼을 누를지 모른다는 1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려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잭슨의 인종차별 또한 지금의 트럼프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잭슨은 대통령이 되자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을 통과시켜 4만5000명의 인디언을 강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체로키 인디언 4000명이 몰살됐습니다.
그러나 맥아담스가 롤모델로 고른 잭슨에 대해 제가 무릎을 치며 탄복한 건, 다른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그대로 빼어 닮은 막말 화법 때문입니다. 생전 열네 번의 결투를 치른 탓에 대통령이 되고도 몸속 어딘가에 탄알 조각을 지니고 살던 잭슨이 대통령 임기를 끝내며 토해낸 다음 두 구절의 후회를 읽노라면 지금의 트럼프와 오싹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내 대선 경쟁자였던 헨리 클레이를 쏴 죽이지 못한 것, 또 하나는 내 밑에서 부통령을 한 존 콜드웰 칼훈을 진즉 교수대에 매달지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맥아담스의 논문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잭슨의 인기가 당시 미 국민 사이에서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와 광부, 멀리 변경의 개척민들로부터도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지금 쓰이는 20달러 지폐에 그의 얼굴이 들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역설은 교활과 냉혹의 대명사로 통했던 닉슨이 중국의 문을 최초로 열고 소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등 실제 치적 면에서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막말과 기행으로 일관해 온 트럼프에 대한 미 국내외 통념이 ‘애틀랜틱’에 실린 논문 한 편으로 혹여 교정(校正)단계를 맞는 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대통령 또는 총리 치고 정신 면에서 문제가 없었던 인물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만 해도 되풀이된 낙선을 참지 못해 몇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고, 영국의 명총리 윈스턴 처칠 또한 심한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번 글은 트럼프의 등장을 겁내 온 많은 한국인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이 중엔 솔직히 말해 저도 포함돼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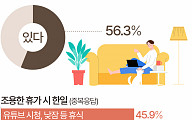



![[정치대학] 이재명 대안은 김부겸·김동연?…박성민 "둘 다 명분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54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