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준 적정 vs 관리비용 커 줄여야...달러 비중 줄이고 투자 대상 다양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적정성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달러가 없던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지만 자본거래의 빗장이 풀린 상황에서 이 정도면 외부 충격을 버틸수 있을지 여전히 논란거리다.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증하는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은 “유동외채(단기외채+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와 3개월 수입액 등 보수적으로 보면 더 쌓을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위기시 외부자금이 이탈해도 예전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든다. 특히 외평채 발행으로 보유액을 늘리면 미국 국채금리와 외평채 금리와의 차이만큼 역마진이 난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원화를 풀게돼 물가 압력으로 다가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불어난 외환보유액을 미 국채 등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낮아 역마진이 우려된다”면서 “외환보유액의 투자처가 다양하지 못하고 수익률도 낮아 기회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용방식에 대한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성 제고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 비중을 늘리는 등 운용처를 다양화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수익률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외환보유액은 정부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수익률이 높지 않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된다.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외화자산 증가액 중 주식, 회사채 등 소위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렸지만 외화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한 전문가는 “3000억달러 수준이 어느정도 유지된다면 수익성에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면서 “높은 달러화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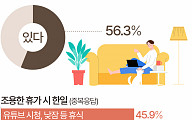



![[정치대학] 이재명 대안은 김부겸·김동연?…박성민 "둘 다 명분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54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