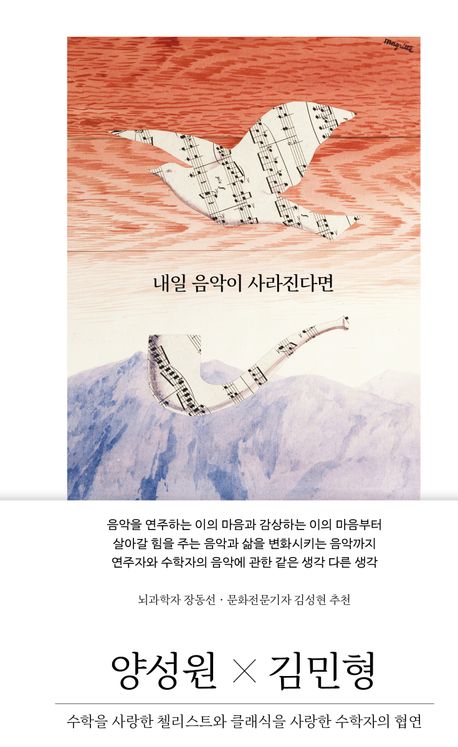
음악과 수학.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문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학문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 책은 '화음은 더하기일까 곱하기일까?', '문화적 전통이 다르면 수학도 달라질까?', '라이브 음악과 레코딩 음악은 정말 다를까?' 등의 질문을 음악과 수학의 상관관계로 풀어낸다. 첼리스트 양성원과 수학자 김민형의 대화로 이뤄진 이 책의 가장 큰 묘미는 각각 세상을 음악과 수학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교감과 부딪힘에 있다.
책에 따르면, 수학에는 음악을 구성하는 감성이, 음악에는 곡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지성이 있다. 첼리스트와 수학자의 대화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다가도 수학의 정교함과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 책에 대해 뇌과학자 장동선은 "세상을 음악의 언어로 학습한 사람과 수학의 언어로 학습한 사람이 만나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세계인 줄 알았으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신묘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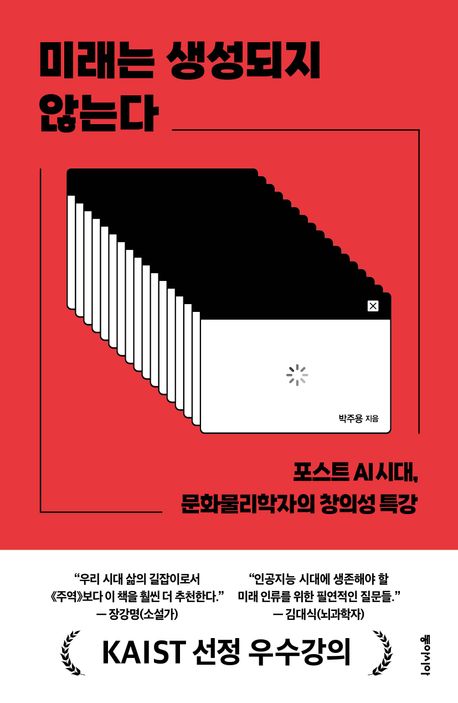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다. 이 같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 바로 AI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현실이 된 지금,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AI의 등장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를 소재로 한 무수한 책과 영화들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과학과 문화에 있다." 이 책의 저자 박주용은 포스트 AI 시대를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책은 현대과학의 탄생부터 위대한 예술가들의 창작 노트까지, 과학과 문화를 접목해 미래를 창조하고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 논한다. 장강명 소설가는 이 책에 대해 "우리 시대 삶의 길잡이로서 '주역'보다 이 책을 훨씬 더 추천한다"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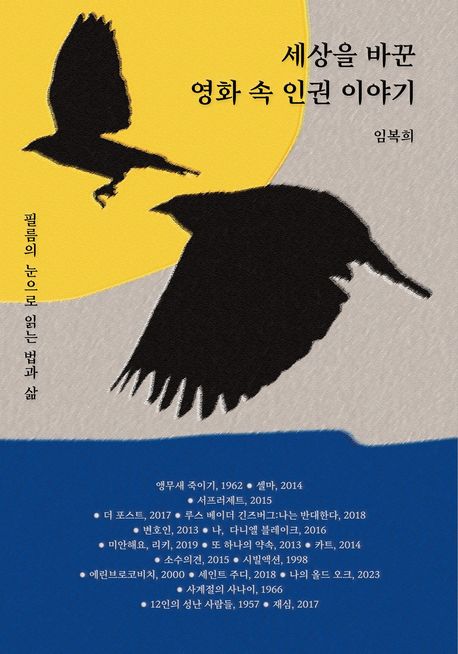
영화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기자, 장애인, 변호사, 난민 등 직업과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전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다. 넓어진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논한다. 저자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복지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미안해요, 리키'를 통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숙고한다. '카트'를 통해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핀다. 나아가 저자는 주인공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추적해 영화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