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및 인구전략 필요”
서울연구원,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 발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는 주된 원인은 주택가격보다 주택공급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옮겨간 요인은 교육과 직장이었다.
12일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주택·가족 등 사유로 12만4870명이 순전출했다. 주요 전출 사유로는 주택 소유,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등이었다.
특히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이다. 결국 양질의 주택 수요와 맞물려 수도권 주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서울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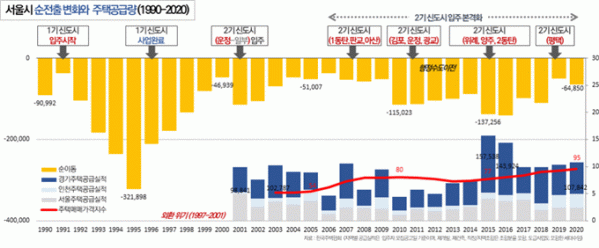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옮겨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출 후 자가 소유 비율이 30.1%에서 46.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주 비율은 42.6%에서 66.8%로 크게 늘었다. 전반적인 주거편익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주택면적(31.4%)이었다. 실제 경기도로 이주 시 주택 규모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62.46%에 달했다. 이는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 시 주택 규모가 증가했다고 답(28.46%)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다만, 서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서울을 방문한다는 응답비율은 주 1회 이상이 50.4%, 월 1회 이상이 81.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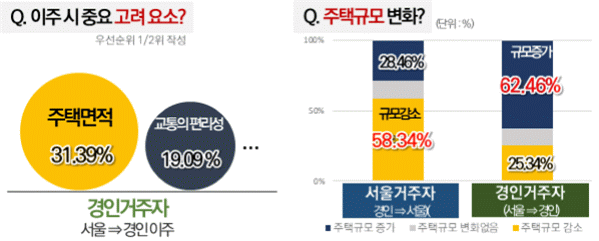
경기에서 서울로 이주한 경우는 2020년 기준 총 7만 5886명이다. 특히 연령대별 조사결과를 보면, 20대에서만 순전입을 보였다. 주요인은 교육과 직장, 교통 편의성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서울 전입 시 평균 통근·통학시간이 감소(72분→42분)하는 등 교통 편익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도 전·출입 양상에 차이가 컸다. 강동·영등포구는 주택을 이유로, 관악·중구·용산·마포는 직장과 교육을 사유로 각각 순전입이 많았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의 인구 감소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과 수준의 주택공급을 하는 등 자치구별 이주패턴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맞춤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