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인터뷰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지쳐버린 이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돈 가방이 나타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은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배우 정우성을 떠나 인간 정우성은 막다른 길 앞에서 마주한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감독 감용훈)로 돌아온 정우성을 만났다. 그는 영화에 대해 “누구나의 인생을 단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지푸라기를 바라지 않는 삶”이라고 못 박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막연한 시절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손안에 들어오는 지푸라기를 꽉 움켜쥐지도 않았어요. 10대였죠.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 떡하니 놓였어요.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무언가를 잡고 싶어서 기다렸지만, 눈앞에 지푸라기는 잡지 않았어요. 물질을 전제로 한 아르바이트 제안들은 모두 거절했죠.”
정우성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를 하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 앞에서 고민해야 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인 누군가는 ‘요행’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우성은 바라지 않은 기회는 외면했다.
정우성에게 지푸라기는 ‘희망’이다. ‘쥐뿔도 없는 내가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다’라는 희망.
“소신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무모함일 수도 있어요. 막연하지만, 제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거 같아요. 그러다 익사했을 수도 있겠죠? 운 좋게 영화배우라는 직업을 얻게 되면서 간절했던 그 지푸라기를 잡고 배에 안착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일본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정우성은 원작 소설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태영이란 캐릭터를 디자인했다. 사라진 애인(전도연) 때문에 사채에 시달리며 한탕의 늪에 빠진 태영을 연기했다. 정우성은 자신의 마음에 집착하는 태영에게 집중했다.

“태영은 연희와 관계에 있었던 마음에 집착해요.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라며 무엇인가 커다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것이죠.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에 기대해요. ‘럭키’라고 쓰여있는 담배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태영의 믿음도 자기 마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어도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영은 합리적이지 못한 낙천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무책임함을 보이죠.”
태영은 제작자와 감독, 여타 배우들의 예상을 뒤엎는 캐릭터로 탄생했다. 전도연도 현장에서 ‘너 이래도 돼?’라며 정우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영화는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 블랙코미디 요소를 가미하는 것인데, 태영이 그런 요소를 다분히 많이 보이는 인물이죠. 아무도 제게 코미디 연기를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영이 좀 더 진지하고 마초 느낌이 나는 캐릭터로 구상했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는 태영에 대해 확신했고, 태영이 나올 때 관객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더 진지했습니다. 모두 즐거워하고 웃어준다고 ‘먹히네. 더 해볼까’ 하는 순간 무너지니까요.”
전도연과 정우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위 ‘된다’ 싶은 배우가 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얻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 관심이다. 반면 필요 이상의 기대는 출연하는 배우들에게 부담감과 같은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으니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프로로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자의 캐릭터를 구현하면 돼요.”
그렇게 힘을 빼니 정우성의 계산처럼 태영이 만들어졌다. 그가 등장하면 괜스레 안심이 된다. 지질한 태영을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실제로 태영이었다고 해도 눈앞에 놓인 돈 가방은 신고했을 것이라는 정우성. “모든 물질엔 사연이 있어요. 단순히 물질로 보이시겠지만, 그 사연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단순히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생각만 하지 않게 되죠. 모든 것을 책임질 의향이 있다면 책임져야겠죠. 근데 지금 정우성에게 돈 가방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시면 모범적인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웃음)
10대 정우성에게 지푸라기는 희망이었다면, 26년 차 배우 정우성에게 희망은 무엇인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잘 죽는 것”이었다.
“남은 것, 나이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성세대가 더 할 수 있다고 우기니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무리를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 얻은 것들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늘 고민해요. 영화 제작도 나눔의 일환이겠죠. 신인 감독이나 아직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도 그래서예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제가 해나가야겠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자신처럼 ‘사회에 참여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다. 자신은 영화 ‘비트’로 출연하면서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배우로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늘 인지하고 행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우성은 “절대적인 칭찬이나 막말은 각자의 기분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제 것이 아니다”며 “저를 성장시키고 되돌아보게 하는 충고는 귀담아듣는다”고 말했다.
늘 자신과 나아가 사회와 대화를 한다는 그에게 가장 소소하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왠지 예상 밖의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던 찰나, 대답을 들었다. 정우성다우면서도, 이 역시 안심이 되는 대답이었다.
“넋 놓을 때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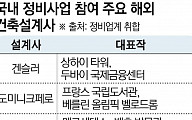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