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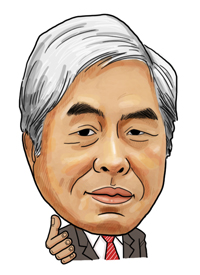
정문회의 회원 중 언론 한길을 걸어온 분이 낡고 삭은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1956년 6월 29일(금) 오후 5시에 열린 ‘녹음의 오후’ 문학공연 팸플릿 등이었다. 내년이면 60년이 되는 자료를 이제껏 보존하고 있다는 것부터 놀라웠다. 자료 중에는 친구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가면서 써놓은 편지도 있었다. 편지는 젊은이답게 유쾌하고, 60년 전의 대학생답게 유식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지력과 필력을 그 또래의 요즘 세대는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 ‘추억의 자료’를 들고 나온 분이 자신은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물건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편지도 발신자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도 동기생에게 돌려주려고 편지를 갖고 나왔다고 한다. 그 돌려줌은 돌려받는 사람에게는 옛 시절을 복원해주는 선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돌려주는 쪽에는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지우는 일이 되는 것일까. 놀랍고, 선뜻 동조하기 어려운 반환이었다.
이렇게 반환과 정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과의 이별 준비이리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의 하염없고 속절없음을 이미 알아버린 나이 아닌가. 그동안의 사연과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미련을 남기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막바지에 행해야 할 중요한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소설가 박경리(1926~2008)의 시 ‘옛날의 그 집’을 읽어본다. ‘(전략) 그 세월, 옛날의 그 집/그랬지 그랬었지/대문 밖에서는/늘/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모진 세월 가고/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그 마음은 삶이 익을 대로 익어 곧 떨어질 만큼 나이가 깊어야만 실감할 수 있으리라. 무엇이든 모으고 챙겨두던 젊은 날과 달리 이제부터는 주고 갈 것, 버릴 것만 있으니 불가에서 말하는 방하착(放下着)의 편안함일 것이다.
사사키 후미오(佐佐木典士)라는 일본인은 최근 번역 출간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여덟 가지를 이야기했다. 못 버려서 후회할 물건은 없다, 여러 개 있는 물건,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 남을 의식해 갖고 있는 물건부터 버려라.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구분하고, 버리기 어려운 건 사진으로 남기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쓰미 나기사(辰巳渚)라는 또 다른 일본인은 ‘버리는 기술’에서 버리기 위한 사고방식 10개조, 버리기 위한 테크닉 10개조를 소개하고 있다. 일정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정기적으로 버리라는 게 핵심이다. 둘 다 정리 정돈을 잘하고 일상의 소소한 일까지 이론화 체계화하기 좋아하는 일본인들다운 말이다.
감나무는 때가 되면 잘 익은 감을 그냥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동물은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한다. 그저 자연스럽다.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은 변화를 통해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일이다. 내려놓기를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필요하다.
버리는 것은 잊히는 준비일 것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모으고 쌓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덜고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뭘 어떻게 버려야 하나. 한 해를 마감하는 세밑이어서 버릴 것, 남길 것, 넘길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