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시했다. 작년 5월까지 21대 국회에서는 몇 차례 법안이 발의됐고,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도 거론됐지만 흐지부지됐다. 22대 국회는 법안 발의조차 없다.
낙태는 빈번히 가불가의 문제로 여겨진다. 좌파는 찬성, 우파는 반대로 갈라져 여성의 몸을 정치화한다. 혹자는 ‘무분별한 낙태’ 걱정에 혀를 찬다. 국회의사당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국회 입구에서 사시사철 ‘낙태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외치는 1인 시위를 보았을 것이다. 낙태가 살아갈 날이 족히 60년은 남은 청년의 건강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이토록 함부로 떠들 수 없다.
낙태 합법화는 ‘허용’ 이상을 내포한다. 그 속에는 여성에게 의료·복지 상담을 제공해,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가 담겨있다. 검진과 시술·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포함된다. 모든 서비스에 책정되는 적절한 비용,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과 지침은 물론이다. 이는 제도권 내 보통의 의료에 당연히 따르는 인프라다.
지난 6년간 원치 않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해진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을까? 진로와 꿈을 이뤘을까? 건강이 상하지 않았을지,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모든 게 미지수다. 아무리 생각해도 탈모약 건강보험 지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개선이 낙태 관련 입법보다 급한 공약이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 정책이 집중되는 지점을 보면 정부에게 각별한 인구집단이 유추된다. 무료 예방접종이 가장 많은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다. 국가검진과 각종 사회인프라 이용 혜택은 6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여성은 어린이를 돌보는 엄마나, 노인을 부양하는 딸로만 살지 않는다. 빛나는 ‘K헬스’에 여성은 예외인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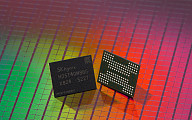


![男 "비용 부담", 女 "맞는 사람 없어"…결혼 망설인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9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