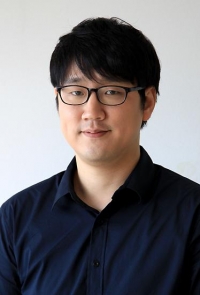
도착 이틀 후 몇몇 선수들과 외국인 코치와 함께 늦은 밤 티타임을 가졌다. 그때 한 이란 선수가 내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한국에서 뛰는 외국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그에 대해 나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샐러리캡이 적용돼 대략 30만 달러(약 3억3500만원) 안팎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선수는 “규정만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선수들의 수입의 이면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재미있지만 씁쓸한 경험이었다. 당시에도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았다. 인터넷은 국내에서 전화선을 사용하던 과거 90년대 초반의 모뎀보다 느린 수준이고 TV 채널조차 몇 개 되지 않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이란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20세를 갓 넘은 선수가 국내 배구 시장의 외국인 선수 몸값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를 거의 모두 알고 있었고, 대략적인 몸값도 익히 알고 있었다. 단지 확인 차원에서 물었던 것이다. 이후 그 선수가 내뱉은 말이 걸작이었다. “그런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한국이 정말 잘사는 나라인가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구단은 바보다.”
이란을 방문하기 반년 전 쿠바를 역시 사업차 방문했다. 당시 행정적인 작업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나마도 함께 방문해야 했다. 현지에서 우연히 몇몇 현지 야구 에이전트들과 만났고, 그들 역시 이란에서 만난 젊은 선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 프로야구단의 30만 달러(약 3억3500만원) 샐러리캡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사실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팀 이름까지 거론하며 지방의 모팀은 관행적으로 다른 구단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는 사실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국내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규정 이상의 연봉을 지불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100만 달러(약 11억1500만원)짜리 외국인 선수가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빅리그가 아닌 한국에서 뛴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B급 혹은 C급 선수에게 A급 선수 이상의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외화 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내 구단들은 저마다 외국인 선수의 몸값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규정을 깨면서까지 출혈 경쟁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이다.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규정을 현실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내 구단들은 웃돈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당장 규정을 지키게 되면 영입할 선수의 폭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몇 년 후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적정한 몸값이 형성되고, 자리잡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국 구단은 바보”라는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948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