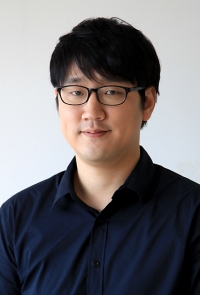
어린 시절 어떤 특정한 기억은 정말 오래가기도 한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내게는 당시의 기억이 ‘공무원=불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힌 계기가 됐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는 내게 “불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야. 주민센터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모르는걸 물어봐도 백화점 판매원처럼 웃으면서 이야기 해주니 말이야”라며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과연 공무원들이 바뀐 것일까? 공무원들의 태도를 모두 나쁘게 말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워낙 강렬했던 탓에 나는 그다지 인상이 좋게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에 내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한 중년 여성 주민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공무원을 또 봤으니 말이다.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 또는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 기관의 부서장과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다. 간략한 전화 인터뷰를 하기 위함이었다. 최대한 예의바르게(?) 소개를 한 뒤 용무를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기관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는 것을 왜 묻느냐”는 성의 없고 퉁명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알고 전화를 한 것이냐”는 훈계까지 들어야 했다.
담당 부하 직원과 이미 사전 인터뷰를 마쳐 대략적인 취재가 끝난 상황이었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책임자 급의 확인이 필요했던 일이었다. 물론 사전에 전화로 약속을 잡고 시간을 맞춰 시도했던 인터뷰였지만 단 3분도 안돼 마쳐야 했다. 심지어 대화 중 부장은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로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누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냐.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 들은 것이냐”는 반문까지 했다. “기관 홈페이지 주요 업무에 소개되어 있는 주요 업무내용”이라는 말에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늦어진 것”이라는 또 한 번의 성의 없는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물론 이는 수 많은 인터뷰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일상 속에서 잊혀지는 수 많은 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같은 예 역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바뀔 것이 아니라 윗 선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따라야 진정으로 변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