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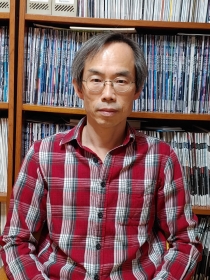
반려동물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관련 정보도 넘쳐난다. 수많은 품종이 개발된 개의 경우 품종에 따른 성격도 자세히 묘사돼 있다. 진돗개는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고 경계심이 크다”, 골든 리트리버는 “온순하고 쾌활하다”는 식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푸들은 “활발하면서도 온순하고 붙임성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품종이 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일까. 그렇다면 동영상 속의 골든 리트리버는 예외적인 녀석들이라는 말인가.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개의 품종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품종은 성격의 9%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생각보다 영향이 훨씬 적었다. 즉 품종을 보고 낯선 개의 성격을 예상하고 행동하면(진돗개를 보고 겁먹고 피하거나 골든 리트리버에게는 다가가 쓰다듬는 등) 안 된다는 말이다.
매사추세츠대 등 미국의 공동연구팀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방문한 견주들에게 개의 성격에 대해 설문하고 일부는 개의 시료를 채취해 게놈을 분석했다. 이렇게 모은 1만8000여 마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순종이고 나머지는 잡종이었다. 연구자들은 성격에 대한 유전과 품종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전의 영향은 25%가 넘었지만 품종의 영향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얼핏 생각하면 모순된 결과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날 개의 다양한 품종 대다수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나왔고 육종 기준은 겉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즉 덩치나 생김새 등은 품종에 따라 유전형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 성격에 관련된 유전형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일조량을 결정하는 위도에 따라 사람의 피부색이 다르지만(이를 기준으로 인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각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성격이 제각각인 것과 마찬가지다.
연구자들은 성격이 관여하는 개의 행동 특성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이 가운데 유전의 영향이 가장 큰 유형이 사람과의 사회성으로 나타났다. 즉 낯선 사람이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개들은 그런 경향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런데 품종만 보고는 사람과의 사회성 정도를 짐작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개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특정 품종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을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를 선택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한편 개와의 사회성, 즉 주변에 낯선 개들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유전의 영향이 다소 있었지만 역시 품종의 영향은 미미했다.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불쾌한 자극에 개가 흥분하는 성향을 뜻하는 ‘동요 역치’의 경우 품종은 물론 유전의 영향도 거의 없었다. 앞서 골든 리트리버의 진돗개 습격을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개에 따라 이런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건 양육 같은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로 개의 품종이 겉모습뿐 아니라 성격까지 결정한다는 기존 설명이 과학 근거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게놈 분석 결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다수 밝혀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람과의 사회성에는 HACD1 유전자의 유형이 영향을 미친다. HACD1은 장기 기억을 조절하고 선천성 근병증이라는 유전성 근육병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개에서는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오랜 세월 인류는 인종을 단순히 피부색을 넘어 지능, 성격 등 많은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물론 지금은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견일 뿐이라는 게 상식이라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면 욕을 먹는다.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품종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상하다는 의문조차 갖지 않는다. 우리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과학의 힘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