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중심·가격 경쟁 구조
ESS만으론 반등 한계⋯EV 시장 수요 병행해야

전기차(EV) 수요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사와 소재사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대안 시장으로 키우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ESS 시장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 공백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기차와 ESS 시장 수요가 모두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는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의 미주법인은 이달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2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기반을 확대했다,
SK온은 9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와 1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 공급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각각 중국 남경 공장과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했다. 국내 오창 공장 또한 이달부터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 라인을 구축해 202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재사도 ESS용 배터리 시장으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 공장은 내년 착공해 2027년 말부터 ESS용 LFP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ESS 시장의 확대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대응하는 신(新) 먹거리로 보고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SS 시장은 전기차 수요 공백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ESS용 배터리 수요는 태양광이나 데이터센터 등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가 이뤄진다. 전기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수년 단위의 장기 계약이 꾸준히 반복될 수 있지만, ESS 시장은 프로젝트가 종료와 함께 공급도 끝나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물량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투자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 오라클이 재무 여건 악화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추진 중인 오픈AI용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ESS용 배터리는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특정 업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LFP 배터리 수요가 높은 ESS 시장에서는 기술 차별화보다 중국 업체처럼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공급자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에서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가 나오기 전부터 ESS 시장에 주목해왔다”며 “캠핑카용 인산철 배터리 같은 소규모 제품부터 데이터센터 등 같은 대형 시설용 배터리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발전시켜 현재는 전 세계 ESS 시장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ESS용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이를 확산시킬 것이냐, 즉 시장 개척에 대한 정부와 기업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이차전지 업종의 실적 기대치 저점 통과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내년 가이던스가 제시되는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내년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세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유럽 EV 시장의 수요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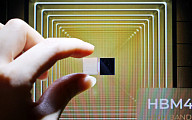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0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