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차장

얼마 전 은행원 연봉에 관한 기사를 썼다가 항의(?) 메일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과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 행원 월급이 삼성전자 직원보다 많은 112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낸 이는 지금도 ‘4시 퇴근하는 베짱이’란 편견 때문에 평가 절하되고 있는데, 기사 때문에 사기가 꺾였다며 불만이 가득했다.
그의 원망을 이해한다. 일 많기로 유명한 A은행에 다니는 동창은 30대 중반부터 탈모약을 먹었다.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품앗이처럼 가입한 통장과 카드가 여럿이다. 만날 때마다 핼쑥해지는 친구를 보며 ‘만만한 직업은 아니구나’란 생각을 했던 터다.
그런 공감 속에서 내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논의의 시작’이다. 현재 은행은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 직무 능력에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쌓인다. 통상 15년 이상 차장급이 되면 억대 연봉자가 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업종 인력 12만5000여 명 중 35%가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은행의 호봉제 집착은 남다르다. 2010년 이후 전 업종의 호봉제 도입률은 30%포인트(p)나 줄었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70% 안팎을 지키고 있다. 이 비율이 50% 넘는 곳은 금융권이 유일하다.
물론 성과연봉제로 바꾸려던 시도조차 없었던 건 아니다. 4년 전 시중은행들은 제도 도입에 나섰다가 노조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전환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호봉제로 남게 됐다.
올 초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교보생명이 금융권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후 반년째 후발 주자로 나서는 곳이 없다.
영혼이 갈릴(?) 정도로 일하는 그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평가 체계를 못 믿겠다는 거다. 지점장은 ‘작은 은행장’으로 여겨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자율경영을 확대하면서 그 힘은 더 커졌다. ‘월급 루팡’으로 불리는 일부 부장급 인사들이 내 목숨 줄(인사평가)을 잡고 있으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무리한 영업은 고객 손실로 연결된다는 업의 특수성도 주요인이다. 수조 원대 피해를 남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은행원이란 이유로 개별 성과를 따질 수 없다는 건 자기변명일 뿐이다. 금융사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 해에만 수천 억 원을 퇴직 비용으로 쓰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기업들이 초격차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경제 혈류인 금융사들은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다.
위기는 늘 세상을 바꾼다.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키워드는 언택트(비대면)다. 구조조정과 맞닿아 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 4년간 멈춰 있던 성과연봉제(직무급제) 논의가 시급하다. 그 시작은 노사 간의 공감과 대화다. 노력이 결실을 볼 때쯤이면 사람들도 ‘은행원의 억대 연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sun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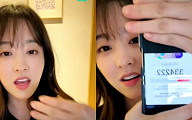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