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규제가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지적한다. FDA의 경우, 패스트트랙과 희귀 약품 지정 등의 방법으로 신약 개발을 권장한다. 반면 식약처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이라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거미줄 규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계 1위 기업 삼성 역시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그만큼 이쪽 분야 규제가 얽히고설켰다는 얘기다. 2016년 3월 바이오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올해 1월 활동을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철폐한 규제는 한 건도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이중규제에 막혔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 본격적으로 시판됐지만, 국내에선 ‘세포유전자 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현재 국내에 50여 곳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환자가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꿈쩍 않는 규제는 기업의 돈줄까지 말린다. 올 상반기 15개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했지만 2곳만 증시에 입성했다. 엄격해진 상장 평가 기준 탓에 상장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한몫했다. 금융감독원이 R&D 회계 기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바이오 기업들이 뒤늦게 R&D 자금을 자산 대신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속출했다.
바이오 업체 한 임원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로만 하라고 하면 바이오 기업의 상장이 힘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바이오 업계는 임상3상이 완료된 신약에 대한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도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3상이 끝나고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국내 임상 실험에는 약 1000명 정도의 표본이 참여하는데, 미국 실험보다 훨씬 작은 규모여서 심사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제 지원 차이도 논란거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약의 종류를 보면 신약, 제네릭 여러 종류 있는데 신약은 세제 지원이 되는데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는 세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사와 환자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하는 원격의료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기득권 반대 등으로 몇 년째 답보 상태다. 데이터 규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의료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85%의 하위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 15%의 가장 중요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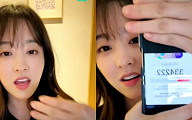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