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지연에 수주 포기까지
청년층, 3D 업종 기피 심각
산업 전반 경쟁력 악화 초래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동력인 ‘장인(숙련공)’이 사라지고 있다.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전통 제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구 감소, 고령화, 저임금 구조가 맞물리며 기술의 전승이 끊기고 생산 차질과 품질 저하 우려까지 이어진다. 숙련공 부족은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동집약 업종인 조선업은 15년 만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산업 불황기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간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력 공백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2014년 약 20만 명에 달하던 조선업 종사자 수는 현재 절반 수준인 10만 명대로 줄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용접·도장·배관 등 ‘장인의 손’이 필요한 공정이 많은데 숙련 인력 이탈로 품질 저하와 납기 지연 우려가 커지는 상태다. 그나마 대형 조선소는 자동화·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외국인력을 늘려 생산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큰 중소업체들은 생산 지연과 수주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외주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공정이 많다”면서 “현장의 기술 단절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붕괴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신기술과 구인력의 미스매치’에 허덕이고 있다. 미래차 핵심 부품, 전장 시스템, 고전압 배터리 정비 등 새로운 영역에선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 기존 정비공·생산직은 새로운 기술 습득이 쉽지 않고 청년층은 3D업종 기피로 유입이 제한되면서 전환기를 뒷받침할 숙련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기차를 팔아도 정비할 인력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소됐던 정비 인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이직과 은퇴가 반복되며 인력난은 심화됐다. 2023년 기준 국내 항공사 12곳의 정비사는 5627명으로, 2019년(5940명) 대비 5.3% 줄었다. 이 기간 항공정비사 자격증 발급 수도 38.5% 급감했다. 항공기 정비의 해외 의존도도 70%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숙련공을 대체할 자동화 장비나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사내외 직무 교육 등을 병행해 숙련도를 높이는 식이다. 정부 역시 외국인력 확대,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숙련공에 대한 인식이다. 숙련공 양성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3D 업종 인식이 고착돼 청년층의 유입이 막히고 있다. 특히 하청·외주 중심의 고용 구조는 숙련 인력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꼽힌다.
숙련공 단절은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장 경험으로 쌓은 숙련 기술은 짧은 교육이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 체계 마련, 안정적인 고용 구조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숙련인력 부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기업 단위의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장 훈련과 고용 연계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숙련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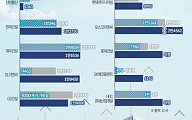






![50만→780만 원…정지선·이수경이 밝힌 술테크 투자법 [셀럽의 재테크]](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18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