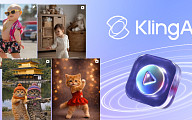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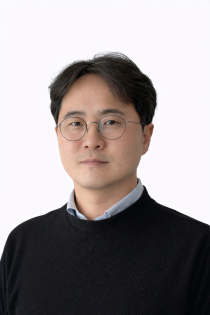
그런데 이젠 불가능하다. 요즘 운동회는 승패가 없다. 뒤처지는 팀이 있으면 응원 점수를 크게 줘 동점을 만들어 버린다. 상도 모두에게 돌아가다 보니, 상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기 어렵다.
더 이상 경쟁도 없고, 성공과 실패도 없는 ‘무균’의 공간이 되어버린 초등학교 교실. 문제는 아이들이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겼을 때의 의기양양한 마음뿐만 아니라 졌을 때의 아쉬움, 억울하게 졌을 때의 분함과 남들보다 한참 뒤처졌을 때의 부끄러움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험 없이 커버린 아이들이, 칼같이 성과를 따지는 사회에 들어가 뒤늦게 좌절하고 방황한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부모들 민원이 큰 몫을 했다.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는 더 이상 교육 그 자체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평가와 경쟁이 불가피한데, 부모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고, 비교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없애 달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말은 못 하고 알아서 조치해주기를 기대하는 방식까지 겹치면 선생님들은 부모와의 소모적 소통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부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사회학자 장경섭의 ‘가족자유주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은 여전히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서구사회처럼 자유를 핵심가치로 채택하면서도 책임은 가족이 진다. 과거에는 외벌이가 많았고 친지와 이웃의 도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형제도 골목친구도 없어 놀이터만 보내려 해도 따라 나가야 하니, 부모도 소진되어 버린다. 학교에 대한 요구가 늘 수밖에 없고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보육기능까지 떠맡게 된다.
황당한 것은 사교육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점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부모는 ‘고객’이 되어 당당하다. 우열을 나눠 아이들을 경쟁시키는데 부모는 오히려 경쟁을 선호한다.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학원 순번은 조용히 기다린다. 공교육이 아무리 무상으로 제공돼도, 보내야 할 학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부모들은 오늘도 학원비 벌러 야근해야 하고 아이들 얼굴 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 편의 부조리극이다.
교육의 정상화는 현장의 소규모 개선이나 제도 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과정 일부를 손보는 방식은 오히려 교육열의 왜곡된 표출을 강화하기 쉽다. 교육문제는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디지털 환경은 인간의 인지와 정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정책은 보육, 노동, 심지어 주거, 산업정책 등과 함께 봐야 한다.
다 함께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그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이길 수 있지만 질 수도 있는 학교로 돌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