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친족이 없고 가난한 정신질환자나 치매 노인에게 무료로 후견인을 붙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가가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법원은 현재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국가가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다.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013년 7월 도입됐다.
통상 후견은 가까운 친족이 맡는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상태나 재산 규모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 후견인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때 피후견인은 직접 후견인에게 매달 일정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재산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돌봐줄 친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치매 노인 등이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이 개시한 성년후견 사건 가운데 당사자의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26.1%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만 남은 비율도 전체 사건에 17.9%에 이른다. 돌봄이 절실하지만 후견인에게 지급할 보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가 후견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공후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현행 공공후견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후견인 보수를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결국 법원은 치매 노인에 대한 후견 신청이 들어오면, 보수 없이 전문가 후견인에게 '청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국선 후견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정원의 송인규(55·사법연수원 34기) 대표 변호사는 "중증치매환자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선후견인 등 공공후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면 후견인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후견인은 후견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들이다. 반면 법원은 국선 후견인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선발한다. 한 달에 15만 원(최대 4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공후견인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법원의 관리 안에 있는 국선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라며 "법원이 월급을 지급하고 전문가 풀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섣부른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후견협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66·10기) 변호사는 "공공후견 지원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의문"이라며 "지자체, 보건복지부, 법원 등 각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설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48·29기) 변호사도 "법원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법원이 공정하게 후견인의 활동을 판단해야 하는데 국선 후견인의 경우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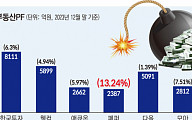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3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