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취지 맞지 않아"⋯ 금감원 매듭 여부 관심

손해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손해율'은 현실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나타낸다. '예상 손해율'은 앞으로 100년간 받을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해 계산한다. 쉽게 말해 실제 손해율은 사고가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 정해지고 예상 손해율은 보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22일 주요 손해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화재는 예상 손해율 96%로 설정했지만 실제 손해율은 88%로 8%포인트(p) 낮다. DB손해보험도 97%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90%에 불과했다. 현대해상은 99%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p 높은 102%를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은 103%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88%로 나타났다. 104%로 예상한 메리츠화재의 실제 손해율은 90%였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보수적 가정이 맞느냐, 예측과 실제를 좁히는 것이 맞느냐'다. 앞선 공시 지표를 놓고 보면 예상 손해율을 가장 높게 잡은 메리츠화재가 잘한 것인지, 예상과 실제의 차이(예실차)를 가장 적게 만든 현대해상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 판단이 갈린다.
논쟁에 불을 붙인 건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14일 컨퍼런스콜에서 일부 보험사가 장기 손해율 가정을 활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해지율 제도가 정비되면서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장기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 간 실적 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 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며 "(일부 보험사가) 이런 비합리적 추정을 통해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에 가입하는 고객층도 큰 차이가 없다. 특정 상품이나 연령·성별에만 쏠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점차 오르고 있는 것도 업계 전반에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김 부회장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당시 손해율 가정의 원칙은 '보수성'이 아닌 '최선 추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잡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위험)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위험조정(RA)을 쌓아두기 때문에 예실차에 있어서는 보수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가 예상 손해율을 높게 잡은 배경에는 '배당 가능 재원 확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예상보다 실제 손해율이 낮으면 그 차이는 '예실차 이익'으로 잡히고 이는 바로 배당할 수 있다. 반면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잡힌 이익은 한꺼번에 쓰지 못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인식해야 한다. 곶감을 줄에 매달아 놓고 시간이 지나 익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당장 배당 재원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사의 손해율은 소비자와도 직결된다. 예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비슷한 상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손해율도 현실에 맞게 추정하는 것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보험사의 철학과 전략이 담겨 있는 손해율 기준, 금융당국의 선택만 남았다. IFRS17 도입 취지대로 '최선 추정' 원칙을 지킬까, 아니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보수적 회계'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을 바꿀까. 보험사 간 '손해율 전쟁'의 끝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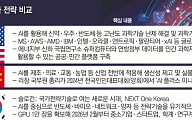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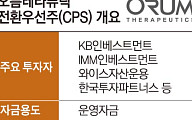

![50만→780만 원…정지선·이수경이 밝힌 술테크 투자법 [셀럽의 재테크]](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18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