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침하 사고가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작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땅꺼짐이 생긴 지 7개월 만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붕괴하면서 지반이 주저앉았다. 13일엔 서울 마포구 차도와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
도심 한복판 싱크홀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다. 땅속은 노후 상·하수도관, 마구잡이 개발 공사, 통신선, 전력선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곪아가고 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그 자체로 ‘시한폭탄’이고, 부실 공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 1127건 중 506건이 하수도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뻔한데도 해결은 더디다. 30년 이상된 노후 상하수도관 총 연장은 각각 5031km, 6029km에 달한다. 연 평균 100km씩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돈도 턱없이 모자란다. 유일한 교체 재원인 하수도 평균 요금은 2023년 기준 t(톤)당 693원으로 원가(1246원)의 56%에 불과하다. 상수도 요금은 최근 인상 전까지 9년간 동결됐다. 경기도 어려운데 ‘물값’ 올려 표 떨어질 각오를 하느니, 눈을 감은 것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은폐한’ 지하 위험지도를 공개하라고 몰아붙이면서도, 요금 올리자는 얘기는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기심과 면피용 처방은 땅속 골병을 부추겼다. 지하철 연장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속도전에 기댄 하도급 구조는 부실공사를 부채질했다.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결과 땅꺼짐 위험도 4·5등급으로 분류되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아무리 받아도 ‘눈 가리고 아웅’에 그쳤다.
성과 없는 대책도 반복됐다. 서울시는 명일동 사고가 나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관측망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며 ‘신기술’ 장비를 동원해 지반변화를 실시간 계측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 후 내놓은 지반 침하 위험 지역 대상 월 1회 GPR 탐사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현란함만 더하고 있는 것이다.
멀쩡하던 도로가 쩍쩍 갈라지고 커다란 구멍 속으로 건물과 차량들이 빨려들어가는 장면은 한국사회와도 닮았다. 2013년 한국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던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맥킨지는 10년 만인 2023년 보고서 2탄을 발표했다.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삶겨지는 개구리처럼 한국도 서서히 몰락할 수 있다던 경고는 “개구리가 이미 반쯤 삶겨졌다”로 수위가 올라갔다.
임계점을 넘어섰는데도 사회 골병을 치료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수십년간 줄줄이 방치돼 왔다. 기득권엔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만 있고, 정치권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겁함만 남았다. 사회적 이동성,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현실은 좌절감에 절었다. 2024년 8월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었다. 30대 젊은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위기의 본질을 바로잡지 않는 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동(空洞)이 어느 순간 모든 걸 집어삼키는 날이 올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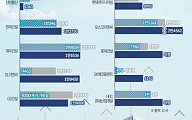

![금값, 내년에도 오르기만 할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26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