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ㆍ강석훈 산은 회장 6월 종료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인선이 사실상 ‘시계 제로’에 빠졌다. 각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거나 아예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공백과 조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달 16일 임기를 마친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각각 오는 6월 6일 임기가 종료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은의 경우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과 운용을 맡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 이들 은행의 리더십 공백은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의 충격을 흡수할 산은과 수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보통 이들 은행의 수장이 임기를 마친 후 후임 인사가 늦어질 경우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산은법과 산은 정관에는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나,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정권 교체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뒤 최대현 전 수석부행장(전무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와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게 순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직무대행 체제 시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실제 인사 추진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예민한 시기 고위직 인사는 정치적 해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수장 공백은 정책 실행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대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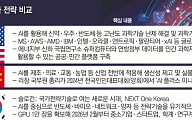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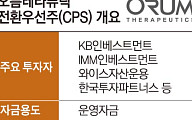

![50만→780만 원…정지선·이수경이 밝힌 술테크 투자법 [셀럽의 재테크]](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18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