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인문학 저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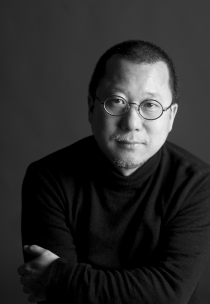
한국에서 태어났음의 불편함을 수락한 채로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집단의 일원임이 틀림없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제가 한국인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어쩌면 다른 나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어쩌다 한국에서 태어나 반감과 혐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빚으며 사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현실에서 오는 압박감과 알 수 없는 곤핍에 시달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압축 근대로의 이행에 따른 과부하일 것이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견줘 한국인의 노동 강도는 세고, 노동 시간은 길다. 그런 연유로 “세계 최고의 일 중독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고, 인구 과밀 사회이며, 자녀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얼굴 성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외래종교인 기독교가 이상 부흥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반면에 최고 수준의 가전제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이고, 첨단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산업 강국이다. 지난 1백 년을 돌아보면, 한국인은 동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전쟁과 남북 분단을 거쳐 갑작스럽게 도시화·산업화로 이동한 사회변동이라는 집합경험의 물렁물렁한 시간을 뚫고 나온다. 한국인들은 근대의 강제된 정처 없음으로 자기를 빚고 어느덧 신자유주의 체제 안으로 들어와 “모든 각자를 자기 자신의 생산자로 개별화”(한병철) 하는 집단 광기 속에서 이념·세대·남녀 간의 갈등, 취업절벽, 인구소멸, 과잉 노동, 계층 간 사다리의 실종, 폭등하는 집값… 따위를 다 겪으며 각자도생의 지옥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 생존자의 일부는 이민이나 유학, 혹은 이주노동자로 비자를 얻어 다른 나라로 떠난다. 보랏빛 미래와 더 좋은 삶을 찾아 먼 나라로 떠난 그들에겐 시난고난하는 이민자의 삶이 기다린다. ‘H마트’는 미국 내 한인들이 주로 먹는 식재료와 한국 화장품과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H마트’는 제 나라를 떠나 미국에서 살며 향수병을 앓는 한국인에겐 더 할 수 없이 좋은 심리치유의 안식처와 같은 장소다. ‘나’는 엄마가 죽은 뒤 이곳에 올 때마다 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여성이 쓴 자전 에세이 ‘H마트에서 울다’란 책은 새삼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게 만든다. 미셸 자우너는 인디 팝 밴드 ‘재패니즈 브렉퍼스트’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이고, 영혼의 절반은 한국인인 젊은 여성이다. “내 영혼 한구석에 한국말의 일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 고백은 ‘태어나서 머릿속에 언어 체계가 잡히는 첫 1년 동안 나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많이 들은’ 삶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인 아버지가 출근한 후 집안엔 모두 한국인인 할머니와 엄마의 자매들뿐이고, 그들은 다 같이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낯선 한국말을 쓴다. ‘내’가 처음 배운 말은 ‘엄마’라는 한국어였다. 자연스럽게 ‘자장자장’, ‘아이고 착해’ 같은 말로 소통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 김밥, 된장찌개, 미역국, 삼계탕, 잣죽, 냉면… 같은 한국 음식은 한국인 엄마와 반쪽만 한국인인 딸을 잇는 정서적 매개다. 엄마를 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나’는 유튜브에서 한국 아줌마가 일러주는 레시피에 따라서 된장찌개와 잣죽을 만든다. 그것은 “엄마를 돌보는 데 실패한 기분을 심리적으로 만회해보려는 노력이자 내 안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고 느낀 문화가 이제 위협받는 기분이 들어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이었다. ‘나’는 자신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사이’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본성을 이루는 여러 요소는 그가 한국인임을, 어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의 특성을 온전하게 가진 사람임을 가리킨다.

미셸이 한국인 엄마를 잃은 뒤 그 부재의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제 안에 온전한 형태로 남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다. 한국인 엄마가 딸에게 퍼붓는 야만스러운(한국인 특유의 극성스러움!) 헌신과, 엄마가 한인마트에서 구한 재료로 해먹인 한국 음식을 매개로 하는 정서적 핏줄이 얼마나 질긴가를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보낸 시간을 추억하는 문장은 수다스러우면서도 적확하며, 준비되지 않은 채 엄마를 떠나보낸 딸이 갖는 상실과 애도, 그 고통과 슬픔은 경이로울 정도로 유려하고 솔직하다. 모녀가 함께 먹은 다채로운 한국 음식의 맛은 풍부한 실감으로 혀에 생생하고, 말기암 환자의 투병과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을 테다.
엄마는 숨을 거두고 가족을 떠난다. ‘나’는 애도의 시간을 견디며 엄마가 남긴 유물을 정리하며 생각한다. “엄마는 나의 대리인이자 기록 보관소였다. (중략) 내가 태어난 때, 결실을 맺지 못한 열망, 처음으로 읽은 책, 나의 모든 개성이 생겨난 과정, 온갖 불안과 작은 승리, 엄마는 비할 데 없는 관심으로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면서 나를 지켜보았다.” 엄마는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대리인이자 기록 보관소를 상실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나’는 엄마가 남긴 유산이다. ‘나’는 그 유산이 망각 속에 방치되고 사라지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자신의 의무임을 깨닫는다. 애도의 한 의례로서 한국인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진 한국 문화는 “내 심장 속에, 내 유전자 속에 펄떡펄떡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실감하고 되새기는 일은 신성하다.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 비친 내 몰골은 내가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나는 생긴 모습도, 정서적 형질도 한국인이다. ‘H마트에서 울다’란 책을 읽는 동안 이 책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다. 엄마라는 닻에서 풀려나기 위해 엄마와 갈등을 겪으며 반항을 하던 미셸이 자기와는 조금은 다르게 생긴 한국인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듯이, 나는 타자가 쓴 거울을 통해 내 안의 과대망상과 허장성세, 피상성과 보잘것없음을, 그리고 내 정체성이 한국인임을 다시 확인한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산다. 아마도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일 것이다. 한국인으로 사는 일의 고달픔과 자긍심은 날마다 내 심장에서 살아 펄떡인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내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인생의 승리를 꿈꾸지 않는다. 인생은 극복만이 전부인 것을! 어쩌면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가장 바깥에서, 달리 말하면 예외 지대에서 외부를 끌어와 내부를 사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제는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낯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죠?’라고 묻지도 않았다. 오늘은 멀쩡한 팔다리를 한 채로 아침에 일어나 사과 반쪽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시장에서 거울을 팔지 말라”는 페르시아 시인의 시를 읽은 뒤 책상에 엎드려 신문사에 기고하는 원고를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빛의 격려를 받으며 노란 꽃망울을 터트린 산수유나무 옆을 지나 산책을 나간다. 지난날은 불행했으나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이 노래처럼 흘러가지 않음에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내일이 올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