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내걸고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막아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평균 보수는 세전 월 41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고, 최근에는 24시간 근무 기준 일급 650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다. 인력 부족은 곧바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한 종합병원은 응급실 근무 의사 6명 중 2명이 퇴사했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해당 시간대에는 응급실 문을 닫는 파행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현장에 그대로 투영된 사례다.
핵심 쟁점은 현행 응급의료법이 규정한 '응급실 전담의사' 제도다. 전담의로 등록되면 해당 의료기관 응급실 업무에만 전속돼야 하며, 타 의료기관 응급실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전문의가 주 30시간 이상 근무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타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는 뚜렷한 차이다.
이 규제가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의료 소외지역인 강원 접경 지역에서 이틀간 응급실 당직을 섰다는 이유로 '중복 인력'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전문의는 전담의 명단에서 제외됐고, 병원은 필수의료 영역 평가에서 'FAIL'을 받아 거액의 정부 지원금 환수 위기에 놓였다.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한 선의의 진료 활동이, 제도상 위반으로 간주돼 병원 경영과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동시에 흔든 셈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매년 전담 인력의 재직 기간과 중복 근무 여부를 확인해 엄격히 조치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의 타 기관 근무 불가’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병원계는 이러한 규제가 응급실 인건비의 비정상적 급등과 만성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전담의 수를 법적으로 묶어두면서도 응급실 운영 책임은 병원에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차 진료부터 배후 진료과 연계까지 떠안아야 해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지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역시 응급의사 부족뿐 아니라 신경외과·심장내과 등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일 의료기관 내 타과 전문의의 응급실 진료 참여조차 공식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응급의료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동일 의료기관 내 타과 전문의의 응급실 진료 참여를 공식 인력으로 인정하고 △응급실 근무 의사의 타 의료기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실 전담의사 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응급실 의사만 유독 두 개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법적 족쇄를 풀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응급의료 공백은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응급의료의 위기는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담의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응급실 문을 닫는 병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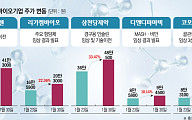



!['니파 바이러스' 공포…설 명절 동남아 여행 비상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902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