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스타임의 기업가치는 무려 8조9300억 원. 전 세계 가장 큰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특히 센스타임이 보유한 기술은 얼굴인식뿐 아니라 복장 등의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분석, 성별과 나이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AI를 이용한 얼굴인식 관련 기술을 리딩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미 얼굴인식 기술은 중국인들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상태다. 공항이나 지하철에서는 얼굴인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의 서비스도 신분 증명의 방법으로 얼굴인식을 속속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휴지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적용할 정도다.
중국이 얼굴인식 분야를 선도하게 된 이유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다량의 얼굴 데이터베이스(DB)가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이는 사회 통제에 관심이 많은 중국 정부가 국민의 얼굴 DB에 접근을 허락하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앞서 거론한 센스타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정부다. 중국 정부는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CCTV를 통해 보행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범죄 용의자를 찾는다. 지난해 12월 홍콩 유명가수 겸 배우인 장쉐여우(張學友)의 중국 콘서트에서는 지명수배자 수십 명이 체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등록 의무화를 결정했다. 휴대전화는 이미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의 얼굴 정보 공개의 의무화를 뜻하는 셈이다.
중국만 이럴까. 미국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일어난 9·11 테러는 미국 정부가 개인의 얼굴 정보를 요구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얼굴 촬영과 지문 등록을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여기에 몇일 전 미국 정부는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 대상으로도 입·출국 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얼굴인식은 지나친 개인정보 독점으로 인해 사회 통제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인권단체들 역시 국토안보부의 얼굴 촬영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삶의 편의’와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눈의 방향을 돌려 한국을 살펴보자. 정부가 1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한다고 한다. 레이저 인쇄로 위조와 변조를 막았고, 카드 재질도 더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꿨단다. 하지만 신용카드처럼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카드는 1990년대에 무산된 뒤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IC칩에 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사진·지문·유효기간 등을 저장한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한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카드로 형태가 바뀌고 위조를 막기 위한 문양만 더했을 뿐, 현재의 주민등록증의 기능은 6·25 전쟁 이후에 썼던 시·도민증과 별 다를 게 없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준 사례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일본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성격의 ‘마이넘버카드’에 IC칩을 적용하고 있다. 충분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많은 우려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은 얼굴인식이라는 새로운 인증 방법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얼굴이 신분증’인 시대가 눈앞이다. 사회의 경직성은 새로운 분야의 경쟁을 뒤처지게 한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핀테크·원격의료·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불발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좌초하고 있다.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일까. 발 빠른 법 제정으로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견제, 보완해 나가는 게 해법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아닐까. 한 달 뒤가 바로 202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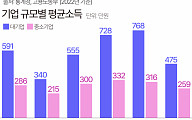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619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