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자본시장2부장

사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지주회사라 부르기 힘들 정도다. 은행을 빼면 카드와 종금 외엔 이렇다 할 계열사가 없다.
이는 MB정권 때 우리금융지주를 쪼개 팔면서 생긴 일이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정부 지분을 통째로 팔기가 어려웠고, 그 대안으로 알짜 회사였던 우리투자증권 등을 분리해서 매각하다 보니 사세가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실제 M&A에 나서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우리금융은 올해 들어 동양과 ABL자산운용을 인수했다. 이어 부동산 신탁회사인 국제자산신탁의 경영권도 가져왔다. 아주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가 하면, MG손보까지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넉넉하지 않은 자금으로 증권사를 인수하기 어려우니 작은 자산운용사부터 인수한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이 두 회사 모두 업계 10위권 밖이다. 둘을 합쳐도 11위권 수준이다. 이런 회사를 가져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특히 MG손보가 인수를 추진하면서 M&A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MG손보는 2013년 새마을금고가 인수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법적인 문제로 직접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내세워 인수를 강행했다.
새마을금고는 자기네 지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팔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MG손보는 극심한 영업 부진으로 고전했다. 결국 인수 4년 만에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에 긴급자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RBC(지급여력) 비율은 150% 밑으로 급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세 차례나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 사이 회사는 대주주를 원망하고 대주주는 회사를 질책하는 마찰이 벌어졌다.
M&A업계에서 보험사를 잘못 인수해 낭폐를 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은행이 인수한 KDB생명이다. 산업은행은 2010년 사모펀드와 함께 KDB생명을 인수했다. MB정권 시절, 산업은행이 민영화 명목으로 단행한 거래였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계속된 적자로 유상증자 등을 포함해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1조 원이 넘는다.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KDB생명은 희망퇴직과 지점 통폐합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그 결과 직원수는 3분의 1로 줄고 말았다. 예컨대 내가 주인이라면 내 집을 맘대로 팔 수도, 살 수도 있다.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머무는 사람이 맘대로 집을 사고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M&A를 하게 되면 덩치는 커진다. 덩치가 커지면 당장 실적은 좋아 보인다. 문제는 시너지가 있든 없든 그 효용과 피해는 몇 년 뒤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과연 산업은행에 진짜 ‘오너’가 있었다면 KDB생명을 인수했을까.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행장을 제대로 견제했다면 승인했을까.
오죽하면 이동걸 산은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애초에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회사”라고 말할 정도일까. M&A를 결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M&A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 없는’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하는 M&A는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 우리금융의 M&A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 회사와 주주가 피해를 본다.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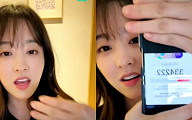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