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달 새 아파트 입주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전국 입주율이 75.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77.7%) 대비 2.5%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입주율은 조사 당월 입주기간이 만료된 분양 단지 가운데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비중이다.
문제는 입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0월(81.9%) 마지막 80%대를 보여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1개월째 70%대에 머물르는 모양새다. 이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4집중 1집은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율은 84.7%(서울 87.6%), 지방은 73.2% 수준이다. 특히 강원권(69.1%)과 제주권(63.6%)이 가장 낮았다.
미입주 사유로는 '세입자 미확보'가 35.3%로 가장 많았고 △기존 주택매각 지연(29.4%) △잔금대출 미확보(2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잔금대출 미확보'의 응답 비중은 전월(14.7%) 대비 8.8%p 가량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건설사들도 입주율을 올리기 위해 입주전담팀을 확충하거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있다.
GS건설은 입주 전담 부서를 꾸려 입주율을 관리하고 있고 대림산업도 별도 TF팀을 꾸려 운영한다. 대우건설도 입주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등 건설사별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입주율 높이기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회사의 수익성 때문인데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이 들어와야 기존에 지출했던 공사비를 제하고도 이익이 남는다. 하지만 이처럼 ‘입주율’이 떨어질 경우 분양물량이 많은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돈 줄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를 언급하고 있고 관련업계가 보는 이달 입주 전망도 어둡다. 10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를 보면 전월(84.4)보다 15.5p 떨어진 68.9를 기록해 60선에 들어섰다.
HOSI는 주택사업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천·경기 등에 10월 전체 입주예정물량의 45%가 몰려있다”며 “인천 송도, 청라와 경기 김포, 고양, 안산 등 대규모 단지 입주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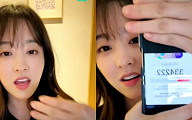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