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썩으면 거름으로 쓰던 ‘雜魚’가 1920년대 쪄서 말리는 가공법 보급되며 1인당 2.4kg 먹는 ‘국민생선’으로 변신 멸치회·조림·젓 넣은 쌈밥 한 입 넣으면 만년 조연이 주연으로… 입안은 황홀경

동해나 남해에서 열기(불볼락)낚시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 멸치란 녀석이 자기 대가리보다 긴 미끼를 따먹다가 낚일 때가 있다. 검은 눈을 애잔하게 반짝이며 낚시 바늘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멸치를 보면 낚시꾼은 황당하다. 낚시꾼의 입장에서 보면 멸치는 생선 같지도 않은 하찮은 녀석인 것이다.
그러나 멸치는 놀랍게도 국민 생선이다. 통계청이 작성한 ‘2017년 어업별 품종별 생산동향’을 보면 멸치의 어획량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총 92만7000톤 중 단연 1위로 21만1000톤(22.8%)이었다. 2위는 고등어류. 우리나라 인구를 약 5000만 명으로 잡는다면 국민 1인당 약 2.4kg의 멸치를 먹는다. 하찮은 멸치가 한국인의 식탁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높은 것이다.
멸치는 조선시대에도 많이 잡혔다. 1820년대에 저술된 풍석(楓石)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동해안에서 어민이 방어를 잡기 위하여 큰 그물을 치면 어망 전체가 멸치로 가득 차서 멸치 가운데서 방어를 가려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많이 잡힌 멸치는 해안 모래사장에서 건조시켜 전국으로 판매하였다. 비가 와서 멸치가 제대로 마르지 않고 썩으면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멸치는 한 그물로 만선하는데 어민이 즉시 말리지 못하면 썩으므로 이를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마른 멸치는 날마다 먹는 반찬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다른 자료에는 염(鹽)멸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조선시대에 멸치는 포, 젓갈, 비료 등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 가공법 덕분에 이젠 식탁의 단골손님으로
멸치의 운명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바로 새로운 건멸치 가공법이 소개되면서부터이다. 1920년대 이후 삶아 말리는 가공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멸치는 더욱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어물이 되었다.
조선 말기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증손녀이며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였던 순종의 황비(皇妃) 순정효황후와 이종사촌이었던 조자호(趙慈鎬·1912~1976)는 조선 왕실의 궁중 요리와 양반가의 전통 음식을 익히며 성장했다. 1939년 출간된 ‘조선요리법’의 저자이기도 한 조자호 여사는 자신의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1930년대 후반 동아일보에 ‘오늘 저녁엔 이런 반찬을’이란 코너를 연재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계절 상차림을 소개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재였다.
“근대국 만드는 법: 근대를 정히 씻어서 잠깐 데쳐 가지고 잘게 썹니다. 먼저 솥에다 토장을 걸러 붓고 근대는 파를 넉넉히 채쳐 넣고 호박도 도톰하게 썰어 섞고 고추장을 조금 치고 참기름을 쳐서 무쳐서 넣으십시오. 꾸미는 고기값이 대단히 비싸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때는 다른 것을 쓰시는데 멜치를 절구에다 대강 빠서 두고 쓰실 때면 정한 헝겊 주머니를 만들어 두시고 넣어 꼭 동여매 넣었다 꺼내 버리면 맛만 우러나서 좋습니다. 시험으로 해 보십시오. 멜치를 통으로 그냥 넣으면 보기에 덜 좋습니다.”(동아일보 1939. 7. 11)
이 기사를 보면 당시 멸치의 새로운 용도와 요리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국물은 고기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데 고기 값이 비싸니, 대용으로 멸치를 사용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두 요리서인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의 ‘조선요리제법’과 조자효의 ‘조선요리법’ 어디에도 국물 맛을 멸치로 내라는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레시피라고 할 수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모두 고기(정육)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자호가 “시험으로 해 보십시오”라고 부기(付記)한 것을 보아도 당시에는 멸치 국물이 실험적인 요리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런 요리법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건멸치는 이 무렵부터 국물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자호는 근대국 레시피를 소개한 위의 기사 하단에 도시락 반찬 하나를 소개한다. “멜치조림: 멜치는 지질한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냄비에다가 진간장, 설탕, 파 다진 것, 참기름을 쳐서 끓이다가 멜치를 넣고 간장이 다 없어지도록 조리면 까맣고 윤이 나는 게 맛이 훌륭합니다.”(동아일보 1939. 7. 11)
이는 누구나 도시락 반찬으로 먹었던 현대의 멸치조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조리법이다. 삶아서 건조하는 멸치 가공법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식탁에서 멸치는 이렇게 썩 훌륭한 조연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멸치는 젓갈과 반찬과 국물용으로 온 국민에게 친숙한 생선이 되어버린 것이다.
◇ 그리고 조연에서 주(主)요리의 명배우 되다
찬물에 밥 말아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막걸리나 맥주 안주로도 먹었던 멸치를 더욱 근사하게 즐기기 위해 부산 기장으로 떠난다. 통영이나 남해 미조항 같은 데서도 멸치야 충분히 맛볼 수 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해산물들이 계절별로 많이 나온다. 기장 역시 미역, 다시마, 꼼장어 등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역시 봄철의 주인공은 멸치다.
서울에서 기장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항으로 가는 KTX를 탄다. 포항이 고향인 오랜 친구 둘이 포항역에서 픽업을 해서 아득하게 찬란한 봄날, 함께 기장 멸치를 즐기자고 밀약을 했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기장까지 이어지는 새로 난 고속도로를 타니 1시간 조금 더 걸려 기장 대변(大邊)항에 도착한다. 마침 멸치축제 기간이라 항구 안까지 차는 들어갈 수가 없다. 멀리 차를 대고 천천히 걸어, 늦은 오후의 햇빛으로 번쩍거리는 대변항의 물빛을 눈에 담으면서 횟집으로 향한다. 친구가 소개한 집은 붉은 방파제 옆의 ‘방파제회식당’(대표 최일곤, 051-721-6155). 상당히 큰 집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는다.
맛있는 건 다 달라는 주문에 먼저 멸치회가 상에 차려진다. 여러 야채와 버무려진 멸치. 덥석 한 젓가락 크게 집어 입으로 가져간다. 초장과 야채, 멸치 삼중주의 화음이 조화를 이루어,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밥을 미리 달라고 해서 비벼 먹어도 본다. 멸치회에 이어 찌개가 나온다. 된장 베이스의 자작한 국물에 배추 우거지와 멸치가 수북하게 담겨 있다. 꽤 큰 멸치들인데도 뼈가 부드러워 발라낼 필요가 없다. 마른 멸치의 맛에 익숙한지라 생멸치의 익은 맛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부드럽고 고소하다.
몇 잔의 소주와 함께 찌개가 바닥이 나자 이번에는 멸치쌈밥이 한 상 차려진다. 멸치쌈밥이란 생멸치 조림에 다시마 등을 여러 반찬과 함께 싸서 먹는 것인데, 그 조합은 자유다. 양배추와 싸도 되고, 상추나 깻잎에 싸도 된다. 밥을 함께 싸서 멸치젓을 올려도 좋다. 내 입에는 다시마에 멸치 두어 마리와 밥과 멸치젓을 올린 큰 쌈이 호응을 한다. 멸치가 조연에서 벗어나 어엿한 주인공이 되어 입을 황홀경으로 몰아간 것은 냉장과 냉동 기술의 발전 덕분이기도 하다. 반찬과 젓갈에서 파격적으로 변신하여 이제 메인요리의 명배우가 된 것이다.
잠시 여주인에게 멸치회 맛의 비결을 물어본다. “초장이지예. 매실액에 여러 과일을 갈아 넣고 숙성하고….” 예상대로다. 멸치야 인근 바다에서 나는 자연산이니 어느 집이나 비슷할 터. 결국 멸치회의 맛은 초장과 손맛이 쥐고 있는 거다.
초로의 아저씨 세 명이 횟집을 나와 부른 배를 두드리며 항구를 배회하다가 “그래도 멸치구이도 먹어봐야지” 하면서 포장마차에 들어간다. 구이 역시 짭조름하면서도 약간은 비릿한 바다 내음이 난다. 소주 안주로는 제격이다. 그렇게 고래가 멸치를 먹어치우듯 멸치로 포식한 봄날이 지나간다. 여름이 오기 전까지 대변항의 봄멸치 파티는 이어질 것이다.
◇ 격양가(擊壤歌) 부르게 해온 ‘대어 중 대어’
멸치잡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잡기도 했지만 멸치 떼가 해안가로 접근할 즈음이면 횃불로 유인해 배로 그물을 치고 해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협동으로 그물을 당겨 잡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전통 조법을 ‘멸치후리기’라고 했고, 제주도 구좌읍, 강원도 양양, 부산 다대포 등지에 그 흔적이 남아 노래가 전해진다. 그중 기장과 가까운 ‘다대포 후리소리’(부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의 메김 일부분은 이렇다.
“메러치 잡아 무엇하리/ 열두 독 젓을 담아/ 황금빛에 맛들거든/ 첫째 독은 헐어다가/ 나라에다 상납하고/ 둘째 독은 헐어다가/ 부모님 전에 봉양하고/ 셋째 독은 헐어다가/ 형제간에 갈라 먹고/ 넷째 독은 헐어다가/ 이웃간에 노놔먹지/ 남은 독은 팔아다가/ 논밭 전지 많이 사서/ 부귀영화 누려보세.”
그 작은 멸치를 잡아 나라에 세금 내고 부모 형제 이웃 간에 다 나누어 먹고 남으면 논밭을 마련하겠다는 서민적 염원을 노랫말에 담고 있다. 크기는 보잘것없지만, 고기 욕심에 눈먼 낚시꾼에겐 가끔 성가신 존재이긴 하지만, 그 잡히는 양이나 국민 식탁에 기여하는 바나, 변신을 거듭하면서 단계적으로 조화로운 맛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멸치는 대어(大魚) 중의 대어다.
문학평론가·(사)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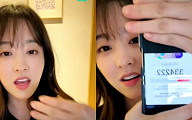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