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거나 말거나, 오래전 연세대 면접시험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 내 마음 싱숭생숭하네.”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앞부분은 대부분의 면접자가 “Winter has gone, spring has come”이라고 번역했는데 뒷부분에서는 모두들 안절부절못한 채 머리만 긁적거리다 면접장을 나갔다. 한데 한 녀석이 문제를 듣자마자 씩 웃더니 “My mind goes this way and that way” 하는 바람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교수들이 박장대소했다. 재치 만점의 그 학생이 합격했는진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시절 송충이를 잡으러 다니던 일이 생각난다. 식목일을 전후해선 송충이를 보기 힘든데 왜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송충이를 잡는 날이면 담임선생님은 나무 젓가락과 유리병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다. 어른이 된 지금도 온 몸에 털이 부숭부숭 난 송충이를 보는 건 결코 상쾌한 일이 아닌데, 어린 초등학생 눈엔 얼마나 무섭고 징그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소나무 가지 위를 설설 기어다니는 송충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유리병 속에 넣는 일은 만만치 않아, 송충이가 젓가락에서 쑥 빠져나와 발등 위로 떨어지곤 했다. 그러면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 눈물까지 찔끔 흘리곤 했다. 와중에 남자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잡은 송충이를 친구들 옷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여자 아이들 코앞에 송충이를 들이대며 놀리는 데 열중하기도 했다. 가끔은 유리병 하나 가득 송충이를 잡는 데 성공한 남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를 위해 잡은 송충이를 선뜻 나눠 주는 훈훈함(?)을 보이기도 했다.
송충이 잡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선 봄소풍이 펼쳐졌다. 봄소풍의 백미는 역시 점심시간이 아니었을까. 엄마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신 김밥에 삶은 계란을 소금에 찍어 먹는 맛이라니.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돈다. 그러고 보니 내 초등학교 시절, 김밥에 삶은 계란은 소풍 가는 날을 위한 특별식이었다. 요즘은 곳곳에 김밥 전문점이 있어 즉석 김밥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고, 삶은 계란을 아침마다 한 알씩 먹고 있건만, 그때 그 맛은 어디로 갔나 싶다.
풍요로움을 얻은 대신 희귀함이 가져다주는 뜻밖의 기쁨을 잃은 걸 보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가난했던 시절을 미화하려는 건 아니다. 먹고살 걱정에서 놓이고 보니, 소풍가는 날이면 부엌에 앉아 주워 먹던 김밥 꼬다리 맛, 가끔씩 특별한 날이면 도시락 반찬에 들어 있던 삶은 달걀 맛, 그 맛 속에 담겨 있던 소박한 포만감을 이젠 즐길 수 없음이 못내 아쉬울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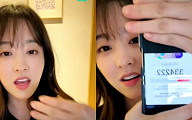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