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골프는 장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골프는 18홀을 도는 동안 드라이버부터 페어웨이 우드, 아이언, 웨지, 퍼터를 사용해 가장 적은 실수로, 가장 낮은 타수로 홀아웃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드라이버 샷은 장타력을 앞세워 홀에 맞게 볼을 보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좋은 드라이버 샷의 의미는 특별하다. 원하는 드라이버 샷을 할 수 있다면 홀을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사실 드라이버의 역할은 다음 샷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다. 누구나 멋진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싶지만 이는 쉽지가 않다.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미국)가 300야드 이상 시원하게 때리면서도 러프 지역을 오가며 들쑥날쑥하는 것을 보면 드라이버 샷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타만 고집하다가 최악의 드라이버 샷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고의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날의 샷은 엉망이 된다. 파워와 롱 드라이빙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홀의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스코어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래도 장타가 욕심이 난다면 임팩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임팩트는 ‘스윙의 꽃’이다. 이 순간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일어나는 ‘찰나(刹那)’이다. 임팩트 구간에서 비거리나 방향성을 비롯해 구질 등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속도를 거리로 전환할 가장 좋은 방법은 볼을 클럽 페이스의 스위트 스포트에 정확히 맞히는 것이다. 이는 컨트롤을 잘 유지해야 가능하다. 어드레스부터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톱스윙을 견고하게 회전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운스윙에 들어간다. 백스윙에서 턱이 왼쪽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도록 한다. 드라이버는 타구할 때 클럽 헤드가 스윙 궤도의 최하점을 지나 올라가면서 볼에 닿도록 하는 어퍼 블로다. 다운스윙에서 턱과 어깨는 최대한 멀리 떨어트린다. 톱스윙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체는 목표 방향으로 이미 이동을 시작한다. 장타는 정확한 체중이동을 전제로 한다. 하체를 목표 방향으로 밀고 가면서 어깨를 유연하게 회전한다.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쪽 팔은 옆구리에 바짝 붙이고 클럽이 안쪽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하면 임팩트 구간에서 가속을 붙이면서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임팩트 이후에도 머리는 어드레스 때의 볼 위치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 임팩트 순간 손의 위치는 어드레스 때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임팩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체중이동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왼쪽은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 폴로스루가 되면서 양손의 위치가 교차된다. 릴리스는 팔을 쭉 뻗어 헤드를 내던지듯 한다. 피니시 동작은 사진을 찍을 때처럼 잠시 목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리도 늘고, 방향도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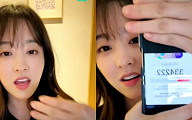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