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딸에게 약속을 강조하시는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음의 정처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徘徊)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셨다.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 날이 많았다. 어머니와의 싸움이 잦았고 그때마다 새벽까지 아버지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거짓말은 거의 상습적이었고 누구도 아버지의 방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공격에 준비된 답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중학생 때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는 성공한 남자였다. 내가 보기에도 안 가진 것이 없는 남자였다. 건강, 경제력, 가족, 친구… 게다가 그 시절 나름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며 여자도 몇 명 거느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참 많이도 놀라서 이불을 쓰고 떨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 “나는 혼자 울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혼자’라는 말이 많았고 ‘외롭다’라는 표현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왜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나? 날개가 있다면 멀리멀리 날아가고 싶다”라는 구절은 어린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결국 아버지의 사업은 바닥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이유를 나는 정서적 허기증(情緖的 虛飢症)이라고 생각한다. 배는 부른데 감정적 허기에 시달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딸이 이루어, 내가 어느 날 시인이 되었을 때 너무 지나친 감격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사극(史劇)에는 딸이 왕비가 되면 애비가 큰절을 하던데 내가 네 앞에 큰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말에 결국 난 울고 말았다. 꼴찌 시인을 왕비에 겨누다니,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1997년 아버지의 장례식 날, 아버지 시집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1999년 ‘아버지의 빛’이라는 시집을 내고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시인이라고 속삭였다.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시인의 이름은 얻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시인’이라고 불러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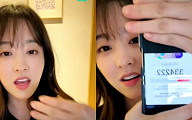



![[컬처콕]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와 닮은 듯 다른 점](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