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실패 용인하는 R&D문화 확산하고
시장성 강화해 공공한계 보완하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장은 대통령실 내 AI(인공지능)수석을 신설하고 네이버 출신 전문가를 초대 수석으로 기용하는 등의 현 정부 초기 행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생태계 구축에서는 사용자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직접 지원 중심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과 해외 AI에만 모든 것을 의존할 경우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정부 주도 성장의 근거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자원을 전략적으로 잘 배분할 수 있는가이다. 혁신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혁신 성과 측정이다. 예컨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사업화 성공률은 기존의 성공적 과제와 비슷할수록 높아진다. 정부 예산 집행을 통해 지원한 대부분 회사들이 사업화에 성공했다면 이를 집행한 공공기관 역시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게 된다.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혁신 없는 혁신 지원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는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실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 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이러한 성공률 위주의 정책 평가 틀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도적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이 역설적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혁신 지원 성패의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AI 기반 성장을 주도하려는 이 시점에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실행수단과 함께 평가지표도 개선해야 한다. 벤처캐피털(VC) 업계를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 소수의 대성공 사례가 펀드 성과를 좌우한다. 높은 성공률보다는 몇몇 성공 사례의 파급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VC와 같은 평가모델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실패를 감수하는 정책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새로운 기술 평가에 시장 지향적 요소를 강화해야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정부 지원에서 졸업하는 것이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실패를 용인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서 실패를 용인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도 존재한다.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 요구할 가능성 같은 것이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문화 속에서 잘 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혁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따라서 빠른 실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과정과 기술개발 노하우를 상세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시행착오 방지에 기여한다면 실패에 대한 페널티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지원기간을 다 소진한 실패가 아니라 빠르게 상황에 맞게 실패를 선언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도 논의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R&D 예산 집행 이력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줄이면서도 고위험·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 기반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AI 지원뿐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혁신하는 전체 생태계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큰 그림도 함께 그려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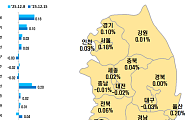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0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