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 이상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대도시 집중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30년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새 도시를 조성하기까지 했음에도 1970년 이래 한 차례 반전 없이 수도권 쏠림이 심화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KDI는 도시 인구 분포 결정 요인으로 생산성과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을 꼽았다. 특히 생산성의 경우 2005년 수도권 도시는 전국의 101.4%, 비수도권은 98.7%로 비교적 유사했지만 2019년까지 전국 도시 생산성은 평균 16.1%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증가율은 20.0%로 비수도권(12.1%)보다 약 8%포인트(p) 높았고, 수도권 생산성(121.7%)이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서게 됐다.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언제나 수도권보다 높았고, 인구수용비용은 수도권이 언제나 비수도권보다 낮았다.
KDI가 해당 지표 관련 가상의 도시규모분포에서 산출한 수도권 비중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상승한 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는 생산성이 주도했다.
다른 요인이 2005년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p 상승한 62.1%에 달했겠지만, 쾌적도(-9.5%p)와 인구수용비용(-2.8%p)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실제 2019년 수도권 비중은 2.4%p 상승한 49.8%에 머물렀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 △세종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원주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 수준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도시별로 10~8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에 이와 가장 유사한 생산성 변화를 보인 국내 도시는 대전(8.7%)으로, 수도권 비중 46% 달성을 위해서는 7개 거점 모두 대전의 2010년대 증가율에 준하는 생산성 개선이 요구되는 셈이다.
KDI는 재정투자를 통해 7개 도시 모두 8%의 생산성 초과 상승을 촉발하고 이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의 경우 2006~2019년간 연평균 약 6000억 원, 누적 약 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인구수용비용은 크게 줄었지만 인프라 건설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201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KDI는 "설령 이러한 전략이 성공해도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46%에 달해 거점도시 육성 전략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할 경우 생산성 제고라는 구체적 목표하에 대상 지역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생산성이 개선돼야 대상 도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지역 성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재정투자를 기업과 인재의 이동·양성 혹은 선별적 산업정책에 집중해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가 공간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선제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정 산업에 산업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결합할 경우 쇠락한 산업도시 역시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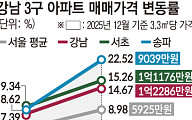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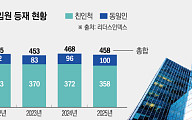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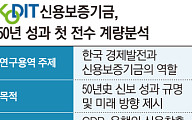

![[찐코노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웃고, 방산주 뜬다…투자 방향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839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