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분리가 마침내 완화됐다. 40년 넘게 유지돼 온 규제의 빗장이 일부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에 한해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원포인트 금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는 분명 숨통이 트이는 조치다. 다만 금융권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아쉬움에 가깝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 활용 길은 열었지만, 금융의 비금융 투자 확대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비금융 사업 진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금산분리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정작 금융권은 여전히 규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자장사만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작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자이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비금융 투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책이냐는 지적이다.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가 의결권 기준 15%로 묶여 있고 업종 요건까지 엄격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현실 인식이다.
CVC 규제 역시 이번 논의에서 함께 다뤄지길 기대했던 사안이다.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100% 자회사로만 보유해야 하고 외부 자금 조달도 40%로 제한되면서, 대규모 벤처 투자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 이 규제를 금산분리 논의의 핵심 과제로 꼽아왔지만, 이번 원포인트 완화에서는 제외됐다. 생산적 금융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해온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금융권도 무작정 규제를 풀어달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내부통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관리되지 않은 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최소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비금융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해 가는 흐름 속에서 국내 금융만 과거의 틀에 묶여 있어서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짙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산업에는 문을 열고 금융에는 문턱을 남겨둔 채로는 생산적 금융도, K-금융의 경쟁력도 완성되기 어렵다. 금융권이 이번 완화를 ‘반쪽짜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정책 당국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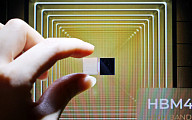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0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