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부 변효선 기자

취업준비생 시절 나도 이런 한탄을 속으로 되뇌곤 했다. ‘스펙은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다. 동기들은 학기 중엔 학점 관리와 대외활동, 방학엔 어학 성적과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다. 잔디밭에 돗자리 펴고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던 캠퍼스의 낭만은 서서히 자취를 감춰갔다.
요즘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팍팍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인공지능(AI) 혁명이 잇따라 산업계를 덮치면서 기업의 취업 문이 좁아졌다. 일명 ‘코딩 불패’ 신화는 챗GPT 앞에서 무색해졌다. 어학 성적 역시 AI 통·번역 기능의 고도화로 예전만큼의 무게를 갖기 어려워졌다.
이 변화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은 전체 실업률이 4%대 초반에 머물지만, 16~24세 청년 실업률만 10%를 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역시 학생을 제외한 청년 실업률이 10%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고임금 블루칼라 직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25세 이하 청년 중 블루칼라 직종 지원자 수가 5년 새 165% 급증했다.
실제로 고소득 블루칼라 직종은 존재한다. 플러머(배관공), 승강기 기술자, 전력선 설치·정비 기사는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 직종은 대부분 주거·상업 개발, 전력·통신 투자 등 경기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큰 데다가 구조적으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만큼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또 고소득은 희소성이 만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들 직종이 청년 실업을 흡수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술 혁신은 모두에게 혜택을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업의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을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청년 실업을 방치하면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도 꺼지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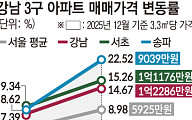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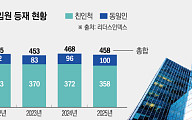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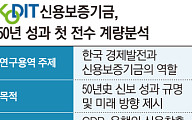

![[찐코노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웃고, 방산주 뜬다…투자 방향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839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