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 중 반려견의 귀속을 두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등록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돌본 사실을 들어 공동 소유를 인정했다.
또 다른 이혼 조정에서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 절차에 협조한다”는 특별 문구를 조정조서에 삽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부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던 전 연인 관계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두고 벌어진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강아지에 대한 각종 진료비 등 양육에 관한 지출 내역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물건(동산)으로 취급한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되며, 동물은 이동 가능한 유체물로서 유체동산에 해당한다.
한편으로는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학대받거나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을 반영했다.
다만 법원은 아직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동물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천성산 도롱뇽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도롱뇽을 원고로 한 소송은 동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동물권 보장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 원고가 길고양이를 돌보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임시보호처를 구했고, 피고가 이를 맡았다. 이후 벌어진 소유권 분쟁에서 법원은 사료 제공, 진료 및 수술 비용 부담, 엄마 고양이의 장례까지 치른 원고의 행위를 인정했다.
야생하는 고양이로서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보아야 하지만, 구조해 임시보호처를 구한 시점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천연 과실인 새끼고양이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
결국 피고는 새끼 고양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유체동산으로만 보지 않고, 돌봄의 연속성과 보호의 책임을 소유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진전된 논의가 있다. 독일 민법은 1990년대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스위스 역시 동물을 물건의 지위에서 분리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동반자적 존재’로 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보라 변호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절반에 가까워지는 현실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규정하는 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이 있지만, 최소한 동물이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점은 사회적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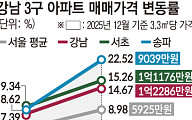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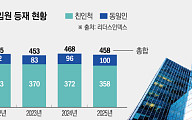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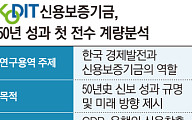

![[찐코노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웃고, 방산주 뜬다…투자 방향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839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