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원장

진료실과 대기실이 문 하나로 나누어진 조그마한 의원에서는 밖에서 나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행여 진료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대기실에서 버럭 소리라도 지르면 진료실 안에서 마음이 콩닥콩닥하기도 한다. 대기실에서 들리는 소리는 진료실에서 환자와 나눈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며칟날 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꽃구경하러 가서 안된다 등 진료실에서는 못 물어보거나 물으려다 까먹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접수와 수납을 하는 직원들에게 쏟아진다.
검사비가 많이 나왔는데 좀 깎아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는 늘 직원들을 난처하게 한다. 나는 몇 년 전에 수술로 담낭을 절제했으니 원장님이 초음파 볼 때 담낭을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초음파 가격을 깎아주면 안 되냐, 내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할 사람 두 명 데리고 왔으니 나는 몰래 혜택을 달라고 하는 등 영락없이 시골 장터에서 일어나는 흥정이 벌어진다.
때론 나도 몰랐던 환자들의 속사정을 직원들이 들을 때도 있다. 주사 맞으면서, 혈액 채취하면서 환자들은 직원들에게 하소연했다. 지난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 아들 녀석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 등 그 이야기들을 직원을 통해 들었을 때 그때 환자분의 얼굴이 왜 어두웠는지 그제야 이해가 된다. 시간에 쫓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이 미안해진다. 그렇게 직원들은 내 부족한 진료를 채워준다. 조그만 의원이지만 분명 나 혼자 진료하는 곳이 아니다. 우린 팀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대기실은 환자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만나네.” 몇 년을 못 만난 이웃을 조그마한 의원 대기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을 하필 여기서 만나 서로 피해 대기실 구석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이혼했지만 둘 다 우리 의원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 둘이 한 대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민망하다. 그 와중에 가수 영탁의 찐찐찐이야~ 휴대전화 벨소리는 우렁차다. 대기실은 작은 마을 같다.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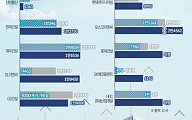






![[찐코노미] 2026년 로봇 산업, 검증의 시간…현대차가 답인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723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