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의 은행사박물관 ‘우리1899’를 15일 찾은 김숙연(55) 씨는 빨간 ‘한일은행 자유저축예금’ 종이통장을 보며 30년 전 추억을 떠올렸다. 대한천일은행, 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평화은행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126년을 이어온 우리은행의 전신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지하 1층에 126년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공간 ‘우리1899’를 재개장했다. 2004년 은행사박물관 개관 이후 21년 만의 새단장이다. 우리은행의 ‘우리’와 대한천일은행 창립 연도인 ‘1899’를 결합해 ‘우리1899’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1899에는 출입문이 없다. 본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구(球) 형태의 360도 LED 스크린 ‘우리타임스피어’가 방문객을 맞는다. 우리은행은 역사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대하소설 ‘토지’의 박경리 작가의 은행원 시절 흔적을 담은 코너다. 박 작가는 등단 전 상업은행 용산 지점에서 1954년 1월부터 약 1년간 근무했다. 손바닥만한 직원명부에는 박 작가의 본명 ‘박금이’가 적혀 있다. 그 옆으로 박 작가의 작품이 실린 상업은행의 사보 ‘천일’ 두 권이 나란히 놓여 있다. 박 작가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놓지 않았다. 재직 중에는 장편 시 ‘바다와 하늘’를, 퇴사 후에는 단편소설 ‘전생록’을 사보에 기고했다.
한참을 서서 박 작가의 영상을 보던 최연수(가명) 씨는 “박경리 선생님이 은행 사보에 발표했다는 작품의 원본을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박물관의 가장 안쪽에는 ‘광통관’의 초기 모습이 재현돼 있다. 키를 훌쩍 뛰어넘는 높이의 거대한 조형물이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이 1909년 설립한 본점 건물 광통관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건물로 현재까지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1914년 화재에서 양 머리 기둥 양식과 건물 상부에 삼각형 모양 페디먼트(박공)이 소실됐다. 허효주 우리은행 학예사는 “화재 재건 과정에서 오늘날의 둥근 장식으로 바뀌었다”며 “당시 일제가 삼각형의 페디먼트를 조선적인 요소로 보고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왼쪽에서는 스탬프 체험을 통해 옛 광통관의 모습을 담아갈 수 있다. 스탬프 코너에 준비된 엽서 위로 세 개의 도장을 연달아 찍으니 3색의 광통관 그림이 완성됐다. 완성된 스탬프 엽서를 안내 데스크에 제시하면 포토부스 ‘우리1899 사진관’의 무료 촬영권도 받을 수 있다.

이날 박물관은 옛 기억에 잠긴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반숙진(64) 씨는 “부모님의 서랍 어디선가 이런 통장을 본 것 같다”라며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은행의 연표를 보던 김영민(가명) 씨는 “한빛은행이라는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숙녀금고’ 같은 건 기억이 안 난다”며 “내 나이가 70인데도 생소한 것도 많이 (전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장 이전의 전시물들도 잘 보존됐다. 허 학예사는 “여기 보이는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이자 국가지정기록물이다”며 “총 97점의 문서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1899년 대한천일은행의 설립부터 고종 황제의 지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화폐개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우리은행의 발자취를 우리18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 2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 ‘우리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푹신한 소파와 매트에서 자유롭게 어린이 경제서적을 읽을 수 있다. 한쪽에는 우리은행 미술대회 수상작들이 전시돼 볼거리를 더했다.
우리1899는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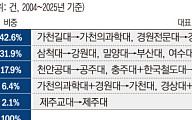



![이찬원→신동엽 출격하는데⋯딜레마 빠진 '지상파 시상식'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320/200/226904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