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처럼 번진 이 질문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의혹 중 하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간 정황을 두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과 특검 역시 이 전 대통령 주장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덕분에 그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무사히 취임할 수 있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도 잠잠해졌다.
그리고 10년 후 광장을 밝힌 촛불은 국회를 움직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끌어냈다. 검찰은 숨이 다한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그를 두 차례 재판에 넘겼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을 단 검찰의 칼끝은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 하는 등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파헤쳤다. 회사의 설립 과정, 의사결정 구조, 수익 배분 등 다스의 소유 관계를 규명하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췄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지금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7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도곡동 땅, 다스 차명 소유가 밝혀졌다면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수사는 대통령 당선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했고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길목에 있었다. 그런데도 수사가 남긴 아쉬움은 크다. 당시 검찰과 특검이 다스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들여다봤어도 무혐의로 결론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내외는 1995~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1796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인물을 수사하며 적폐를 청산하는 데 선봉 역할을 해왔다. 적폐청산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은 인정하지만 10년이나 지체된 정의를 정의라 부르며 적폐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체된 정의를 정의가 부르기 전에 왜 수사에 실패했었는지 검찰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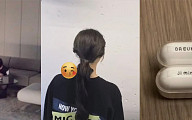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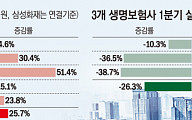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258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