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커뮤즈파트너스 대표이사

하지만 그 판매처가 바이럴이 강한 SNS 채널이라면 높은 기대치의 후폭풍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머지않아 ‘속인 자’와 ‘속은 자’를 찾는 게임이 무조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해 탈모케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후 지금에서야 겪고 있는 SNS 역풍이 단적인 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니기에 마케터의 근심을 공유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제품의 어떤 장점에 현혹됐든 업체와 개발자 입장에선 알 수 없다. 다만 지갑을 열어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떤 채널이든 같은 기대 패턴을 보이는데 제품 가격이 비싸다면 기대치는 제곱이 된다. 회사 제품은 기하급수적으로 팔리고, 탈모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동병상련’ 카톡방을 만들어 기대평과 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제품 사용후기는 호평보다 안 좋은 글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임상 결과도 보유한 제품이지만 카톡방에서는 서로 위로를 건네며 산 사람은 ‘속은 자’가 되고, 산 제품은 ‘속인 제품’이 되고 만다.
6개월이 흐르면서 악플을 달았던 그들과 소통을 시도해보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싶다. 제품을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덩달아 가세하는 걸 보니 스트레스도 배가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제품 판매량이 늘 때마다 쾌재만 불러댔던 그때가 후회스럽다. SNS의 ‘기대치 부메랑’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결과다.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 칭찬은 기대감이 되고, 기대감은 지갑을 열게 했으나 소비자들은 아직 충성도가 부족하고 귀가 얇았던 것뿐이었더라. 들은 바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 제품의 가치를 보고 주머니를 연 것이 아니었다. 브랜드 가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마케터의 오만이었으며, SNS 채널의 기승전결을 모두 시뮬레이션하지 못한 낙담의 최후가 된다. 이제 어째야 하며 해결 방법은 있는 것인가. 눈앞이 캄캄해진다.
고난은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 전문가를 찾아 위기극복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상품개발팀에 성분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재차 체크해본다. 제품 효과가 발현되지 못한 이유가 ‘규칙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돼도, 자잘한 개선점도 눈에 띈다. 시간이 지나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불만 고객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사용법을 좀 더 꼼꼼하게 학습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
불만 고객과 공개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높은 기대치를 방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하려 한다. 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하루 단위 영상을 촬영케 하고 규칙적인 사용이 전제된 상태라면 제품 효과는 반드시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확약할 생각이다. 쉽게 식어 다시 타오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사용자와 느린 소통을 다시 시작할 요량이다.
SNS 소비자의 열풍은 브랜드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다. 소탐대실은 물론이거니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는 대망대실 또한 등한시하지 말아야 하겠다. 막무가내로 좋다고 해 팔린 제품일수록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또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후폭풍을 미리 염두에 둬 브랜드 가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옛말은 언제나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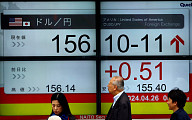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77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