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면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곤 한다. 꼼꼼하게 점검하여 철저하게 대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물난리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병 아닌 병으로 인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앙)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것도 그때뿐, 다시 ‘설마’ 하는 방심 속에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그러고선 또 당한다. 사람이 영리한 것 같아도 참 멍청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가 많이 오면 축대가 내려앉았다느니 옹벽이 무너졌다느니 하는 뉴스가 적잖이 나온다. 축대는 ‘築臺’라고 쓰는데 각각 ‘쌓을 축’, ‘누대 대’라고 훈독한다. 따라서 축대는 ‘누대처럼 높이 쌓아올린 터’를 말한다. 비탈진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이 들어앉을 자리를 계단식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때 비탈의 위편을 깎아 아래편을 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아래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쌓고 흙이 밀리지 않도록 겉부분을 돌이나 시멘트로 둘러쌓는다. 이것이 바로 축대이다.
옹벽은 한자로 ‘擁壁’이라고 쓰는데 각각 ‘안을 옹’, ‘벽(Wall) 벽’이라고 훈독한다. 직역하자면 ‘안고 있는 벽’이다. 무엇을 안고 있다는 것일까? 흙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즉 흙이 밀리면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흙을 안고 있는 벽이 바로 옹벽이다.
축대는 ‘築(쌓기)’을 잘해야 하고, 옹벽은 ‘擁(안아서 버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둘러쳐야 한다. 그런데 築이나 擁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축이나 옹의 임무를 방심 속에서 책임감 없이 처리하면 그 축대와 옹벽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터지게 된다. 그래서 인재라고 한다.
장마는 지났지만 이제 태풍 철이 다가오고 있다. 축대와 옹벽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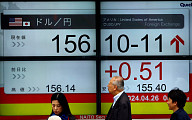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7886.jpg)